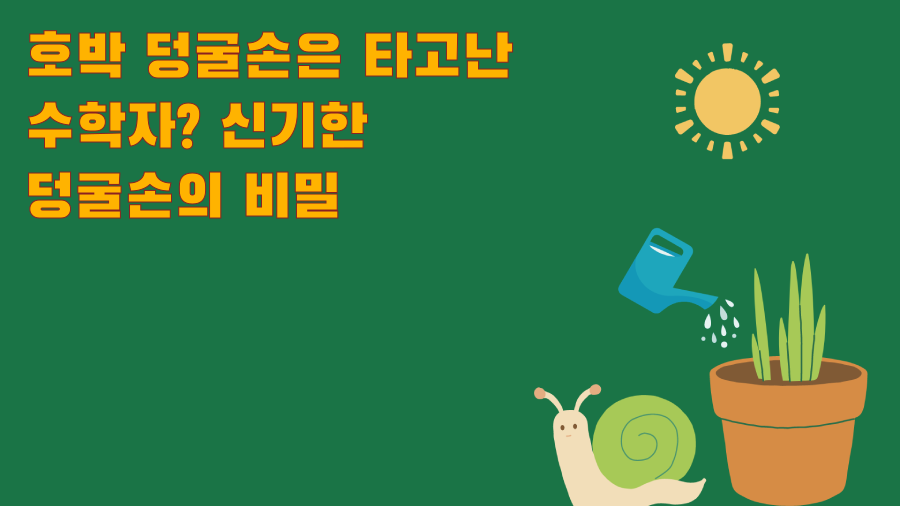“호박 덩굴손은 어떻게 꼬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박 덩굴손이 그저 뭔가에 기대어 자라는 줄기라고 생각할 뿐,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적 비밀에 대해서는 짐작조차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호박 덩굴손의 세계를 탐험하며 놀라운 수학적 아름다움과 과학적 원리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덩굴손의 신비로운 비밀, 꼬임과 팽팽함의 조화
호박은 덩굴식물로, 줄기 전체가 휘감는 대신 덩굴손이라는 가지를 뻗어 나뭇가지나 바위 같은 물체를 붙잡습니다. 마치 산악등반가가 줄기를 이용해 바위틈에 볼트를 박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단순히 덩굴손이 물체를 휘감는 것만으로는 줄기를 튼튼하게 고정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덩굴손은 말단이 물체를 휘감은 후, 중간부분이 마치 전화선처럼 꼬이면서 팽팽해집니다. 놀랍게도 덩굴손이 꼬일 때 절반은 시계 방향으로, 절반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꼬일까요?
덩굴손은 한쪽 방향으로만 꼬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선이 한 바퀴 돌 때마다 360도 회전해야 하므로, 물체를 붙잡았던 끝이 물체에서 떨어진 뒤 바로 한 바퀴 돌고 다시 붙잡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덩굴손은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덩굴손은 절반을 시계 방향, 절반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꼬아 길이를 줄이면서도 팽팽하게 유지하는 똑똑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덩굴손 꼬임의 비밀, 목질화의 역할
호박 덩굴손이 꼬이는 비밀은 바로 ‘목질화’에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물리학자와 생물학자들은 유연한 덩굴손이 일단 붙잡을 곳을 정하면 가지의 한쪽만 목질화가 되면서 수축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아직 자유로운 덩굴손의 단면은 균일한 반면, 물체를 붙잡은 뒤 가지가 스프링처럼 꼬여 팽팽해진 덩굴손의 단면은 한쪽에 목질화된 세포가 뚜렷이 보입니다.
‘섬유리본’이라고 부르는 목질화된 부분은 세포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층의 목질화된 정도가 다릅니다. 목질화가 많이 된 층이 덜 된 층보다 더 많이 수축하면서 나선을 이룬다고 추정합니다. 연구자들은 덩굴손에 분해효소를 처리해 섬유리본만 얻었는데, 예상대로 나선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호박 덩굴손은 스프링? 놀라운 과학적 메커니즘
결국 덩굴손 가지는 말단이 물체를 잡으면서 목질화가 시작되고, 목질화된 부분의 선을 따라 수축하면서 나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호박 덩굴손을 만져 보면 자유로운 덩굴손은 부드러운 반면, 고정돼 스프링을 이룬 덩굴손은 꽤 딱딱합니다.
논문을 보면 건조한 덩굴손을 당길 경우 처음엔 양쪽 나선이 더 감기다가(overwind) 당기는 힘이 더 강해지면 견디지 못하고 풀립니다. 호박 덩굴손으로 실험해보니 정말 처음에 살짝 당겼을 때는 양쪽 나선이 만나는 부분이 두 나선이 더 감기는 방향으로 살짝 돌아갑니다. 이렇게 더 감기면서 당기는 힘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자연 속의 수학, 덩굴손, 꼬투리, 그리고 나선
호박과 오이가 덩굴손을 비대칭적으로 목질화시켜 나선을 만들었다면, 콩과 식물은 꼬투리에 섬유 방향을 교묘하게 배치해 씨앗이 익으면 서로 붙어 있던 꼬투리 양쪽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선을 만들게 힘을 받다가 결국은 봉합선이 터져 씨앗을 퍼뜨린다는 사실이 2011년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꼬투리 막은 서로 수직 방향으로 섬유소가 배치된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겹쳐진 섬유소는 마치 바둑판 줄무늬 같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꼬투리가 나가는 방향은 이렇게 배치된 두 섬유소에 대각선 방향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깥층 섬유소가 꼬투리의 긴 축 방향과 45도라면 안층 섬유소는 135도를 이룹니다.
가을이 깊어져 씨앗이 여물면 꼬투리도 마르는데, 이때 나란히 있는 섬유 사이의 부분이 수축합니다. 바깥층 섬유소 방향, 안층 섬유소 방향에 따라 수축하는 정도가 비대칭이 되면서 힘이 쌓이다가 결국 꼬투리 양쪽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선을 그리며 터집니다.
숨겨진 아름다움, 다시 보는 호박
오이, 호박, 콩.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평범해 보이는 식물들이지만, 과학자들은 여기서도 비범한 현상을 알아차리고 차근차근 실마리를 풀어 마침내 생물학뿐 아니라 물리학, 수학의 측면에서도 아름다운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이들 연구 덕분에 호박을 재발견한 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콩과 식물을 찾아 꼬투리를 좀 따와 관찰해 봐야겠습니다.
| 식물 | 꼬임 메커니즘 | 특징 |
|---|---|---|
| 호박, 오이 | 덩굴손의 비대칭적 목질화 | 한쪽 층이 더 많이 수축하여 나선 형태를 만듭니다. |
| 콩과 식물 | 꼬투리의 섬유소 배치 | 씨앗이 익으면 꼬투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선을 그리며 터집니다. |
오늘 알아본 내용 어떠셨나요? 흔하게 볼 수 있는 호박 덩굴손에도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앞으로는 길을 걸을 때 주변의 식물들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아마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흥미로운 식물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블로그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